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장 발언 일주일 만에 국내 식품업체 5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전격 단행했다. 기업 간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올린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물가 안정에 협조해달라”는 메시지를 연일 내면서 식품업계는 말 그대로 ‘물가 인상의 근원지’가 됐다.
올해 들어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했거나 가격 인상을 예고한 식품ㆍ외식업체는 수십 곳에 이른다. 인상 품목을 보면 간편식과 빵, 라면, 커피, 음료, 주류, 외식업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1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 폭(3.6%)을 기록했다. 마트와 편의점, 식당 등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의 경우 식품 가격 인상에 따른 체감도가 더 크다. 관계 당국이 식품기업에 대해 칼을 빼 든 이유다.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틈을 타 이때다 싶어 가격을 올린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이번 조사의 배경으로 작용한 듯싶다.
식품업계는 억울함을 호소한다.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은 사실이나 원가 상승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더는 감내하기 어렵다는 차원에서다. 현재 이상기후 등 이슈로 국제곡물과 설탕, 커피 원두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데다, 물류ㆍ인건비 이슈도 고개를 들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상계엄 발 고환율 리스크도 불거졌다. 원재료 상당 부분을 수입해 가공해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예기치 못한 부담이 된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 관계자들이 물밑에서 가하는 압박에 식품업체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앞서 공정위의 주장대로 기업들이 서로 간 ‘밀실 합의’를 맺고 제품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다면 이는 시장원리를 왜곡한 불공정 행위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의 가격 인상 행위 자체만으로 ‘담합’이나 ‘탐욕’으로 해석하는 방식은 위험하다. 식품기업은 본질적으로는 상품 판매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기에 정부가 일률적으로 통제하거나 낙인 찍어서는 곤란하다. 이번 공정위 조사 역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먹거리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한 정부의 가격 개입이 어느 선까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식품업계는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가격 인상 발표와 철회라는 웃지 못할 촌극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억눌렸던 가격 인상 고리가 뒤늦게 풀리면서 더 큰 물가 상승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정부의 ‘찍어누르기 식 물가관리’는 돌고 돌아 기업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돌아온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4089.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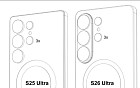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4253.jpg)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4120.jpg)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2577.jpg)



![삼성전자 주가 이제 겨우 '여기' 입니다. '여기까지' 열고 보세요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IZ_RFIDF4Po/mqdefault.jpg)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신기계, 원전 밸류체인 부각에 上⋯코스닥서 보성파워텍ㆍ우리기술ㆍ일진파워 등 ↑](https://img.etoday.co.kr/crop/85/60/2284281.jpg)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84253.jpg)
![KB금융그룹, 보험-은행 복합점포 ‘KB골든라이프 플래그십 센터’ 오픈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842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