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중국 마늘 세이프가드 발동 후 보복
기업들 “국내산업 보호 조치 강구 가장 원해”

글로벌 주요 국가들은 중국발(發) 저가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공고한 철벽을 쳤다. 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중국의 보복 관세 가능성을 고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제언한다.
2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에서 이뤄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총 6300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조사를 개시한 국가는 1071건을 시행한 인도로 집계됐다. 미국(817건), 유럽연합(EU·533건), 브라질(427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155건으로 후순위에 머물렀다.
미국, 유럽연합(EU), 인도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2000년대 들어서 반덤핑(덤핑 국가 및 수출품에 고율 관세 부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상계관세(외국산 상품에 직접 부과하는 별도 관세) 같은 수입 규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왔다.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이 같은 추세는 더욱 뚜렷해졌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 이전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해온 대표 국가다. 2016년에는 중국 기업들이 냉연강판을 원가 이하 가격에 팔면서 시장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중국산 냉연강판에 사상 최고 수준의 522%(반덤핑 265.79%·상계관세 256.44%)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었다. 지난해에도 중국산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에 대해 기존에 적용됐던 반덤핑 및 상계관세율 약 30~86% 수준을 5년간 연장했다.
EU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중국 당국의 전폭적인 보조금을 받은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현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업체별로 7.8~35.3% 포인트(p)의 추가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례로 상하이자동차그룹(SAIC)에는 45.3%의 최고 세율이 적용됐다. BYD는 27%, 지리자동차는 28.8%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인도는 지난달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철강 판재류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이후 일부 예외품목(전기강판·전기아연도강판 등)을 제외하고는 품목별로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도에 수출하면 12%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도 정부는 철강 판재의 외국산 수입 증가로 인도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글로벌 주요국들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못 이겨 수입 규제를 내놓는 것과 달리 한국의 상황은 정반대다. 한국은 내수 시장이 크지 않고 수출의존도가 높아 적극적인 무역 조치를 시행한다면 해당 국가와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강도가 높은 무역장벽으로 꼽히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은 2000년 6월이 마지막이다. 당시 한국이 중국산 마늘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자 중국이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의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을 입혔다.
다만 국내 제조업이 중국산 저가 공세에 피해를 보게 되면서 한국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국내 제조기업 222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원정책으로 ‘국내산업 보호 조치 강구(37.4%)’를 가장 많이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반덤핑 심의 조사를 시행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소요돼 사실상 산업 보호 수단이 전무하다는 평가도 잇따른다. 실제 현대제철은 지난해 7월 중국산 후판의 저가 공급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반덤핑 제소를 했으나, 올해 2월에서야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위원회 예비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문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덤핑 조치 등 수입 규제는 국가 차원의 무역 조치며 국내산업 보호 같은 산업 정책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무역구제정책 등과 관련해 해당 국가와의 대화·교섭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4089.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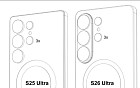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4253.jpg)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4120.jpg)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2577.jpg)



![삼성전자 주가 이제 겨우 '여기' 입니다. '여기까지' 열고 보세요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IZ_RFIDF4Po/mqdefault.jpg)

![[BioS]온코닉, 'PARP/TYKS' 난소암 2상 IND 승인](https://img.etoday.co.kr/crop/85/60/2089797.jpg)




![로봇ㆍ밸류체인 '수직 계열화' 계획…모비스·글로비스까지 재평가 [‘피지컬 AI’ 날개 단 현대차]](https://img.etoday.co.kr/crop/85/60/2284242.jpg)
![‘정의선 체제’ 5년, 시장이 답했다…'기술의 힘' 시장이 공인 [‘피지컬 AI’ 날개 단 현대차]](https://img.etoday.co.kr/crop/85/60/2284243.jpg)
![새 성장 엔진은 '로보틱스'⋯100조 클럽, ‘車’가 아닌 ‘플랫폼’ [‘피지컬 AI’ 날개 단 현대차]](https://img.etoday.co.kr/crop/85/60/2284245.jpg)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84253.jpg)
![KB금융그룹, 보험-은행 복합점포 ‘KB골든라이프 플래그십 센터’ 오픈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842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