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윤상현씨가 미국 보스턴 시의원에 출마해 천신만고 끝에 당선됐다. 그의 선거유세 경험담은 재미있었다. 어느 집을 방문해 한 표를 부탁했더니 할머니가 윤씨를 일본인으로 착각하고 “우리는 진주만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라며 문을 닫아버렸다. 그렇다. 아직도 많은 미국인은 일본의 진주만 침공을 잊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들의 감정과는 달리 국가의 발길은 오직 국력을 바탕으로 한 국익에 좌우될 뿐이다. 최근 미국과 일본은 오랫동안 쌓아온 밀월관계를 공식적으로 재확인했다. 태평양전쟁은 박물관에 보관해 두고 말이다.
미·일 방위조약의 새로운 지침에 합의한 두 나라는 자위대가 전 세계에서 미군의 후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가정이긴 하지만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일본은 한국에 개입할 것인가, 개입한다면 한국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인가 등의 이슈들이 우리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다. 잘못하면 우리의 맹방이라던 미국이 일본을 시켜 한반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까 봐 걱정이다. 한·미·일 관계에서 한·일이 다툴 때 미국은 늘 최종적으로 일본 편을 들었다. 1910년의 한일합방을 결과적으로 묵인한 1905년의 협정이 그랬고, 독도 처리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든 1952년의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협정 교섭도 그랬다.
미국은 지금 우리에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도입을 바라고 있다. 중국은 이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대신 우리에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권유했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보수를 지지 기반으로 삼은 박근혜 정부는 THAAD 도입에 따른 비용보다 안보적 실익을 우선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럴 경우 우리나라 최대 무역국이라는 관계를 넘어 ‘전략적 동반자’로 성큼 지위가 격상된 중국은 우리에게 ‘어느 편이냐’고 선택을 강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UR나 FTA 같은 낯선 영문 약어(略語)가 농민들과 내수기업의 희생을 내포한 채 한국경제가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가를 요구하더니 이제는 THAAD나 AIIB처럼 더욱 생소한 약어가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의미와 함께 개화기 조선의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동북아 정세가 불확실해질수록 고 이승만 전 대통령같이 국제정치 감각이 뛰어난 통찰력 있는 리더가 아쉽다. 그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사람에 따라 엇갈리지만 말이다. 세계사의 흐름을 날카롭게 간파한 이 박사는 1941년 ‘Japan Inside Out’이라는 책에서 일본이 동남아 지역을 침공해 전략적 물자를 확보하고 곧 미국과 전쟁을 벌일 것으로 예측했다. 책이 출간된 지 6개월 만에 일본은 진주만을 침공하지 않았던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은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군비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으로 쪼개져 있고, 사회는 여전히 동서로 갈라져 있다. 한국을 50-30클럽, 다시 말해 인구 5000만 명이 넘으면서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거나 그에 근접한 7국(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의 하나로 만든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양극화라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고 세계경제의 불안정한 파도가 언제 국내 경제를 덮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적어도 우리의 운명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라로 확고하게 자리 잡는 날은 언제나 올까.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상당한 경제력, 정치력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자본이 사회 전반에 걸쳐 충분히 쌓여야 한다. 한마디로 국력을 키워야 한다.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첫째 각자가 해야 할 일을 꼭 해야 하고 둘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해야 할 일은 동반성장, 역지사지, 그리고 소통이다. 피해야 할 것은 탐욕, 독선 그리고 오만이다. 그렇다.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위기의 파고를 넘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선택하기 위해선 말이다.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4089.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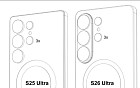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4253.jpg)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4120.jpg)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2577.jpg)



![삼성전자 주가 이제 겨우 '여기' 입니다. '여기까지' 열고 보세요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IZ_RFIDF4Po/mqdefault.jpg)



![[내일날씨] 최강 한파에 서울 체감 ‘영하 20도’…전라서해안·제주도에 많은 눈](https://img.etoday.co.kr/crop/85/60/2281678.jpg)


![[BioS]온코닉, 'PARP/TYKS' 난소암 2상 IND 승인](https://img.etoday.co.kr/crop/85/60/2089797.jpg)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84253.jpg)
![KB금융그룹, 보험-은행 복합점포 ‘KB골든라이프 플래그십 센터’ 오픈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842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