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에 100년 넘은 어시장이 있다면 서울에도 8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어시장이 존재한다. 바로 필자가 근무하는 대방동에서 10분 거리에 자리한 노량진수산시장이다. 조선시대부터 한강진·양화진과 함께 서울 삼진(三鎭)을 이룬 노량진은 백로(白鷺)가 노닐던 나루터라 해서 이름 붙여졌는데, 수양버들이 울창해 노들나루로도 불렸다. 서울 한복판에서 바다 내음을 맡을 수 있다니! 비린내에 유혹되는 날엔 제철 해산물의 짭짤한 맛을 즐기러 갔다. 지금은 현대화 사업을 둘러싸고 상인과 수협 간 갈등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하지만 24시간 활어처럼 펄떡이던 곳이다.
어리숙한 필자는 호객 행위를 하는 이들에게 바가지를 쓰기도 했다. 시장 상인들이 호객꾼을 고용할 정도로 경기가 좋을 때의 일이다. 경기침체로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호객꾼의 익살이 그리운 건 비단 나뿐만은 아닐 듯하다. 그런데 호객꾼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일본말에 뿌리를 둔 ‘삐끼’가 떡하니 표준어로 올라 있다. 의미는 ‘호객 행위를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순화어를 밝히지도 않았다. 언중의 입길에 많이 오른다 하여 표준어로 인정했다지만 불편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삐끼는 끌어당긴다는 뜻의 일본어 ‘히쿠(ひく)’에서 파생된 명사 ‘히키(ひき)’를 강하게 발음하면서 생긴 말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주로 당구 용어로 쓰였다. 그런데 젊은층에서 호객 행위나 호객꾼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다, 유행어가 됐다. 그렇다면 삐끼를 대신할 만한 우리말은 없을까? 오래전부터 우리 전통시장에는 손님을 끌어들여 물건을 사게 하고 가게주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여리꾼이다. 여리꾼은 상점 앞에 서서 손님을 기다린다는 뜻의 ‘열립군(列立軍)’에서 나온 말로 여겨진다. 열립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리’로 변했고,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꾼’이 붙었다. 여리꾼이 손님을 끌어들인다는 뜻의 동사는 ‘여립켜다’이다. 이리 좋은 우리말이 있으니, 앞으로 ‘삐끼’는 여리꾼으로 바꿔 부르는 것이 좋겠다. 당구장에서도 ‘히키’는 ‘끌어치기’로 써야 할 것이다.
서비스업계가 이벤트는 물론 기발한 상호로 손님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드가장모텔(숙박업), 추적60병(호프), 누렁이를 찰스로(애견숍) 등의 상호는 큰 웃음을 주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횟집 중에는 ‘회까닥’이 눈길을 끈다. 맛이 너무도 좋아 정신이 어떻게 된다나 뭐라나. 회까닥은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지는 모양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해까닥이라 말하고 쓰는 이가 있는데, 회까닥이 바른말이다.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의 회는 도대체 어떤 맛일까.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https://img.etoday.co.kr/crop/140/88/2262755.jpg)
![[AI 코인패밀리 만평] 문제가 문제](https://img.etoday.co.kr/crop/140/88/2265455.jpg)

![단순 배탈과 차원이 다르다…‘노로바이러스’ 어떻게 피하나 [e건강~쏙]](https://img.etoday.co.kr/crop/140/88/2265529.jpg)
![‘피부 미인’ 만드는 K재생 흡수기술⋯세계 여심 흔든다[차세대 K뷰티 슬로우에이징]](https://img.etoday.co.kr/crop/140/88/2265559.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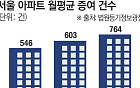



![테슬라 주가 '이때' 대책 없이 성장합니다! ㅣ 강정수 블루닷AI 연구센터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B202M7TyqO0/mqdefault.jpg)









![“정말 돈 없고 구멍난 옷 입었는데”...추성훈이 180도 달라진 비결 [셀럽의 재테크]](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65245.jpg)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방향과 과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6580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