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전 군복무 중 의문사한 '허일병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타살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허 일병에 대한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 지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못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국가는 유족들에게 3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주심 이상훈 대법관)은 10일 군 복무 중 사망한 허원근 일병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3억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됐다는 점에 부합되는 듯한 증거들과 이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들만으로는 부대원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사망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타살이라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렇다고 해서 허 일병이 폐유류고에서 스스로 소총 3발을 발사해 자살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헌병대가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로 인해 현재까지도 사인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허 일병은 1984년 4월 폐유류고에서 소총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졌다. 당시 군 당국은 자살로 결론지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허 일병이 타살된 것이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새벽 시간 머리에 총상을 입어 숨졌고, 이후 군 내부에서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오전 11시쯤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긴 다음 가슴에 추가로 두차례 총을 더 쐈다"며 타살로 결론지으며 국가가 9억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M16소총을 3발 쏴 자살했다"며 손해배상액을 3억으로 감액했다. 당시 이 사건을 두고 스스로 소총을 3발이나 쏴 자살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4089.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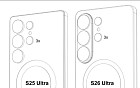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4253.jpg)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4120.jpg)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2577.jpg)



![삼성전자 주가 이제 겨우 '여기' 입니다. '여기까지' 열고 보세요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IZ_RFIDF4Po/mqdefault.jpg)



![[내일날씨] 최강 한파에 서울 체감 ‘영하 20도’…전라서해안·제주도에 많은 눈](https://img.etoday.co.kr/crop/85/60/2281678.jpg)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84253.jpg)
![KB금융그룹, 보험-은행 복합점포 ‘KB골든라이프 플래그십 센터’ 오픈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842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