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사주(자기주식)는 한때 기업의 쌈짓돈이었다. 주가가 낮을 때 사두었다가 시장이 오르면 팔아 자금을 확보하거나 주가를 떠받쳤다. 재무적 유연성 확보라는 명분 아래 내부정보를 잘 아는 기업이 스스로의 주가를 조정하는 구조였고 공정성 논란이 뒤따랐다.
이제 시장의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자사주는 ‘팔기 위한 주식’이 아니라 ‘없애기 위한 주식’이 됐다. 매입 이후 곧바로 소각을 단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자사주 소각 테마주가 들썩였다.
예컨대 코스닥 상장사 동일기연은 21일 47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목적으로 매입을 개시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앞서 7월 초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소식에 부국증권과 신영증권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단기 주가 부양보다 ‘발행주식 수 축소’라는 구조적 변화에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변화의 배경에는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주주환원 촉진책이 있다. 기업들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적극 소각하도록 유도하면서, ‘보유 후 매각’ 중심의 관행이 ‘매입 후 소각’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소각은 배당보다도 확실한 주주환원이다. 한 번 소각된 주식은 다시 시장에 나오지 않기에, 잠재적 매도 압력을 영구히 제거한다.
이 같은 변화는 공정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기업은 누구보다 실적과 미래 전망을 잘 안다. 그런 주체가 자사주를 이용해 시세를 조정하면 내부자 거래 논란이 불가피하다. 소각 중심의 자사주 정책은 이런 불신을 원천 차단하고, 정보의 비대칭이 없는 시장으로 가는 신호가 된다.
물론 자사주를 자본정책의 유연한 수단으로 쓸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유통된 주식을 소각하는 게 훨씬 강력한 주주친화 메시지로 작용한다. 시장은 이제 기업이 ‘언제 파느냐’보다 ‘언제 없애느냐’를 본다.
자사주 소각 열풍은 일시적 유행이 아니다. 주주를 비용이 아닌 동반자로 대하는 경영문화의 변화이며, 한국 자본시장이 성숙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상징이다. 자사주는 기업이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과거의 자사주가 경영진의 쌈짓돈이었다면, 지금의 자사주는 신뢰를 되돌려주는 주주의 몫이 됐다.


!["가족 계정 쫓아내더니"⋯넷플릭스, '인수전' 이후 가격 올릴까?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140/88/2265997.jpg)
![[단독] 한수원 짓누른 '태양광 숙제'…전기료 상승 이유 있었다](https://img.etoday.co.kr/crop/140/88/196057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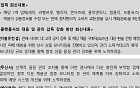



![한국 대형마트엔 유독 왜 ‘갈색 계란’이 많을까 [에그리씽]](https://img.etoday.co.kr/crop/140/88/2265783.jpg)



![테슬라 주가 '이때' 대책 없이 성장합니다! ㅣ 강정수 블루닷AI 연구센터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B202M7TyqO0/mqdefault.jpg)




![[진료실 풍경] 보디랭귀지(body language)](https://img.etoday.co.kr/crop/85/60/2266093.jpg)
![[시론] 자율주행 기술을 보는 ‘불편한 진실’](https://img.etoday.co.kr/crop/85/60/2266086.jpg)
![[이투데이 말투데이] 정문입설(程門立雪)/베선트노믹스](https://img.etoday.co.kr/crop/85/60/2266090.jpg)
![[논현논단] ‘규제의 역설’ 위에 싹튼 쿠팡사태](https://img.etoday.co.kr/crop/85/60/2266088.jpg)

!["가족 계정 쫓아내더니"⋯넷플릭스, '인수전' 이후 가격 올릴까?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65997.jpg)
![우원식 의장, 나경원 의원 필리버스터 '중단'…항의하는 국민의힘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6605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