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채 30년물을 중심으로 초장기 국고채 발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2030년대 중반에는 전체 국고채 잔액의 절반 이상을 초장기채 경과물이 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초장기채 경과물 누적은 국고채 시장의 유동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국가채무 또한 지속해서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절대적인 국채 규모는 현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고채 만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자본시장연구원(KCMI) 채권연구센터는 KCMI 이슈브리핑 '국고채 만기 장기화의 배경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열고 효율적인 국고채 시장 관리를 위해 정책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이날 브리핑 직전 인사말을 통해 향후 KCMI 이슈브리핑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면서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소통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국내 채권시장에서 초장기채인 국고채 30년물은 2012년 도입돼 상대적으로 발행 시기가 늦은 편임에도, 발행이 빠르게 증가해왔다. 30년물의 발행 비중은 2015년 11.1%에서 2018년 23.2%, 2021년 26.5%, 지난해 30.2%까지 늘어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국고채 평균 만기도 빠르게 장기화했다. 2014년 7.1년에서 2024년 13.2년으로 10년 새 6.1년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요국인 일본(1.7년), 스페인(1.6년), 프랑스(1.5년), 호주·이탈리아(0.6년), 미국(0.2년)의 평균 잔존만기 변동 폭이 2년 이하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다.
자본연은 국고채 만기 장기화의 원인으로 보험산업 제도 변화로 인한 보험사의 초장기물 수요 증가를 지목했다. 장보성·정화영 자본연 채권연구센터 박사는 "보험사들은 새로운 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도입으로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되면서 초장기 국고채 매입을 통해 자산 듀레이션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통상 보험사 부채는 듀레이션(만기)이 매우 긴 구조로 되어 있어 금리 위험 관리를 위해 듀레이션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보험사는 본드 포워드(미리 정해진 날짜에 약속한 가격으로 채권을 매매하기로 약정하는 장외파생상품) 시장을 통해 국고채 초장기물을 대규모로 매수해 자산 듀레이션을 확대하는 전략을 택한다.
여기에 국고채 이외의 초장기물 발행은 제한적인 구조적 요인도 배경으로 꼽았다. 채권 종류별로 보면 초장기물의 안정적인 공급은 실질적으로 국고채(88.1%)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으며, 이 밖의 특수채(9.2%), 회사채(2.6%), 금융채·지방채(0.1%) 등 초장기물 발행은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와 같은 발행 비중이 유지된다면 국고채 평균 만기는 2033년 정점인 14.2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초장기채 경과물 또한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봤다. 초장기 국고채는 지표물에서 경과물로 전환되면서 유동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국고채 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이 구조적으로 하락할 우려가 크다.
장보성·정화영 자본연 채권연구센터 박사는 향후 국고채 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초장기채 경과물의 유동성 모니터링 강화 △국고채 만기의 효율적인 분산 관리 △중장기적으로 초장기물에 대한 발행 집중도 완화 등을 제언했다. 또 국고채 만기 분산을 위해서는 조기상환과 교환을 활용하고,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국채 발행한도를 현행 총발행에서 순증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장기적으로 초장기물 발행 집중도를 완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보성·정화영 자본연 채권연구센터 박사는 "인구 구조 변화 등에 따른 보험사의 성장성 둔화와 초장기물 수요 약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만기 1년 이하의 단기 국고채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한다면 단기 안전자산 공급을 통해 금융시장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부연했다.

![BTS 뜨자, 들썩이는 티켓값⋯올해 인상 릴레이 시작될까? [엔터로그]](https://img.etoday.co.kr/crop/140/88/2278150.jpg)
![산리오 가고 리락쿠마·먼작귀 온다…이디야·롯데시네마 콜라보 [그래픽]](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1648.jpg)

![[환율마감] 원·달러 10일째 올라 3주만 최고…엔화약세+달러매수](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150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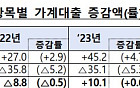





![에코프로 '이때' 무섭게 오를 수 있습니다. 뜻밖에 만날 호재와 상승 모멘텀 분석해드립니다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F5mfHb3Z8_o/mqdefault.jpg)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화갤러리아우·천일고속 ‘상한가’…코스닥선 아진엑스텍 등](https://img.etoday.co.kr/crop/85/60/2281682.jpg)
![[채권마감] 보합권 속 커브만 스팁, 미국채 강세 vs 금통위 경계](https://img.etoday.co.kr/crop/85/60/2270791.jpg)




![[환율마감] 원·달러 10일째 올라 3주만 최고…엔화약세+달러매수](https://img.etoday.co.kr/crop/85/60/2281506.jpg)
![BTS 뜨자, 들썩이는 티켓값⋯올해 인상 릴레이 시작될까? [엔터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78150.jpg)
![서울 시내버스, '역대 최장' 파업에 퇴근길 이틀째 '교통대란'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817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