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2018년 대법 판결 후 3년 內 소송 제기 인정

‘시효 만료’를 이유로 일본 기업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던 107세 강제동원 피해자가 2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재판장 임은하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씨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김 씨는 1944년 7월부터 약 1년간 일본 나가사키현 소재 미쓰비시 조선소에 강제로 끌려가 일했다. 1945년 8월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 떨어졌고 피폭 피해를 본 그는 그해 10월 귀국했다. 이후 2019년 4월 김 씨는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2022년 2월 1심은 일본 기업의 손을 들어 줬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취지였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또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심은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2018년 대법원이 전범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본 정부의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원고가 강제로 끌려가 비인간적 노동을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명백하다”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로 비로소 대한민국 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나기 이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강제징용 관련 소송을 여러 건 맡아온 한 변호사는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확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2심에서 일부 승소로 뒤집히는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슷한 흐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제징용 당시 근무기간이 짧거나, 근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경우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면서 “다만 2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일본 기업이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BTS 뜨자, 들썩이는 티켓값⋯올해 인상 릴레이 시작될까? [엔터로그]](https://img.etoday.co.kr/crop/140/88/2278150.jpg)
![산리오 가고 리락쿠마·먼작귀 온다…이디야·롯데시네마 콜라보 [그래픽]](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1648.jpg)

![[환율마감] 원·달러 10일째 올라 3주만 최고…엔화약세+달러매수](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150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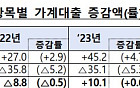





![에코프로 '이때' 무섭게 오를 수 있습니다. 뜻밖에 만날 호재와 상승 모멘텀 분석해드립니다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F5mfHb3Z8_o/mqdefault.jpg)
![[날씨 LIVE] 오전까지 전국 곳곳 비·눈… “출근길 ‘도로 살얼음’ 주의”](https://img.etoday.co.kr/crop/85/60/2281674.jpg)
![서울 시내버스 협상 극적 타결⋯임금 2.9% 인상·정년 65세 연장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281769.jpg)


![[내일 날씨] 새벽 눈·비 뒤에 미세먼지까지⋯출근길 살얼음 주의](https://img.etoday.co.kr/crop/85/60/2278436.jpg)





![BTS 뜨자, 들썩이는 티켓값⋯올해 인상 릴레이 시작될까? [엔터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78150.jpg)
![서울 시내버스, '역대 최장' 파업에 퇴근길 이틀째 '교통대란'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817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