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전에는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이 살았는데. 시골집 마당 나무 그늘에만 가도 시원했는데.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대관령 아래 산골마을에서 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다. 감나무 아래에 멍석을 깔고 누워 부채를 부치며 새소리와 매미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시원했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 마당가 그늘이 아무리 시원해도 원두막만큼 시원하지는 않다. 예전에 여름이 되면 우리 형제는 마당가에 원두막부터 지었다. 원래 원두막은 과수원이나 참외 수박밭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마당가 감나무 아래에 공중 다락을 지었다.
마당가에 서 있는 큰 감나무 아래에 그 감나무를 한 축으로 굵은 나무 세 개를 더 세우고 키 높이보다 훨씬 높은 곳에 허공 다락을 만든다. 다락은 보릿짚 위에 멍석을 깐 다음, 다시 매끈한 왕골자리 한 잎 더 올려서 깐다. 감나무 잎이 충분히 해를 가려주지만, 저녁때 모기가 달려들지 못하도록 방 모양의 모기장을 칠 수 있게 헐렁 지붕도 만든다.
그런 공중다락에서 마당가에 주렁주렁 달려 있는 꽤(재래종 자두)와 포도를 바구니째 따와 그 위에 올려놓는다. 그러니 여름이 그다지 더운지 몰랐다. 요즘 시장에 자두는 나도, 자두의 원조가 되는 재래종 꽤(다른 지역에서는 ‘에추, 고야’라고도 불렀다)는 나지 않는다. 크기도 방울토마토 작은 것만 한데, 맛도 자두보다 아주 훨씬 시다. 원두막에 앉아 신 자두를 먹으면 오싹한 맛에 더위가 저만치 달아난다.
봇도랑은 냇물에 보를 막아 그 봇물이 논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든 작은 도랑이다. 이틀에 한 번은 동생과 함께 봇도랑을 뒤진다. 그 작은 봇도랑에 미꾸라지와 쌀미꾸리가 마를 날이 없었다. 지금은 봇도랑을 뒤질 아이도 없지만, 봇도랑에 노는 고기도 없다. 농약을 쓰기 시작한 다음 거의 씨가 말랐다.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밤하늘에 작은 불빛을 이을락 끊을락 날아다니던 반딧불도 비슷한 시기에 자취를 감추었다.
얼마 전엔 반딧불 추억이 그리워 일부러 강원도 봉평 이효석 선생 생가 마을로 반딧불이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시골집 마당에 형제가 모이면 그 시절의 봇도랑과 반딧불 이야기를 한다. 저녁 풍경도 잊을 수가 없다. 시골의 저녁밥은 늘 늦다. 어른들이 논밭에서 늦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저물어 밭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저녁을 지을 동안 우리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저녁 먹을 자리를 마련한다. 멍석 옆에 모깃불도 피운다. 주위는 점점 어두워지고 밤하늘의 별은 그대로 밥상에 쏟아져 내릴 듯 초롱초롱하다.
그 시절엔 은하수의 자잘한 가루까지도 헤아릴 만큼 눈이 좋았다. 저녁을 다 먹으면 형제들이 멍석에 누워 별을 바라보며 학교에서 배운 별자리를 찾아보기도 하고, 움직이는 별처럼 아주 천천히 밤하늘을 가로질러 떠가는 인공위성을 찾아내기도 한다.
다시 갈 수 없는 날의 추억은 늘 이렇게 내 마음 안에 아름답다. 이것이 어디 나 하나만의 추억일까. 내가 살았던 대관령 아랫마을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골 마을의 여름 풍경과 그곳에서 자란 사람들의 추억이 이렇지 않을까. 이 추억 속에 우리는 저마다 자기 생애에서 가장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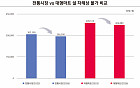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85920.jpg)
!['계속되는 한파가 반가운 사람들'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8622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