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다. 불빛 몇 개가 켜졌다 꺼졌다 할 뿐인데, 왜 마음이 편안해지고 때로는 옅은 멜랑콜리까지 불러오는 것인가?
트리의 전구는 대부분 깜빡이는 속도와 밝기가 조금씩 다르다. 어떤 전구는 잠깐 쉬었다가 켜지고, 어떤 전구는 다른 것보다 반 박자 늦게 반짝인다. 이 작은 차이들이 모여 하나의 부드러운 흐름을 만든다. 뇌는 바로 이런 약한 불규칙성을 좋아한다.
모든 전구가 정확히 1초에 한 번씩, 똑같은 밝기로 동시에 켜졌다 꺼진다면 뇌는 금세 지루함을 느낄 것이다.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자극은 뇌에게 ‘이미 다 아는 정보’가 되어 주의의 중심에서 밀려난다. 반대로 불빛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밝아질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로 마구 튀어 오른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뇌는 계속해서 대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언제 경보음이 울릴지 몰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은 상태다. 이런 자극을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트리 불빛은 이 두 극단 사이에 있다. 불이 켜지고 꺼지는 전체적인 리듬은 느슨하게 유지되지만, 정확한 타이밍은 알 수 없다. 이런 자극은 뇌를 과도하게 긴장시키지 않는다. 그렇다고 완전히 꺼지게 두지도 않는다. 뇌과학에서는 이 상태를 편안한 주의 상태(relaxed attention)라고 부른다. 장작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바라보거나, 파도를 보거나, 눈이 내리는 장면을 멍하니 바라볼 때와 같은 상태다. 트리 앞에서 마음이 풀리는 이유다.
쌀알 반 톨만 한 전구들이 내는 빛은 하나하나로 보면 그리 크지 않다. 그런데 불을 끈 어두운 방에 트리를 켜는 순간, 그 작은 점들이 공간 전체를 채워 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빛은 전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벽과 천장 그리고 공기 속까지 은은하게 퍼져 나간다. 이 느낌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다.
어둠 속에서 인간의 눈은 명암 대비에 훨씬 더 민감해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 눈의 망막에는 두 종류의 시각 세포가 있다. 밝은 낮에 주로 쓰이는 원추세포와, 어두운 환경에서 작동하는 간상세포다. 방이 어두워질수록 원추세포는 쉬고, 간상세포가 전면에 나선다. 간상세포는 색을 잘 구분하지는 못하지만, 아주 약한 빛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별빛 정도의 밝기에도 반응할 수 있을 만큼 예민하다.
이 상태에서 어둠 속에 작은 전구 하나가 켜지면, 그 전구는 주변의 어둠과 강한 대비를 이룬다. 뇌는 빛의 ‘절대적인 양’보다 주변과의 차이, 즉 대비를 더 중요하게 해석한다. 그래서 실제로는 작은 빛이지만, 훨씬 크고 더 따뜻하게 인식한다. 겨울 밤의 트리가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환해 보이는 이유다. 작은 빛이 큰 위로가 되는 까닭은 이처럼 물리적으로도 설명된다.
트리의 모양 역시 안정감에 한몫을 한다. 대부분의 트리는 형태가 꽤 규칙적이다. 위로 갈수록 가지는 짧아지고, 아래로 갈수록 넓어진다. 이런 구조는 자연에서 자주 나타나는 프랙털과 닮아 있다. 나뭇가지, 산맥, 번개, 혈관도 비슷한 규칙을 따른다. 흥미로운 점은 인간의 뇌가 이런 구조를 볼 때 안정감을 느낀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진화해 왔기 때문에, 자연의 패턴을 닮은 형태를 마주하면 무의식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낀다. 트리가 편안한 이유는 장식 때문만은 아니다. 그 형태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수학적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트리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약간 불규칙하게 깜빡이는 빛은 뇌를 쉬게 하고, 어둠 속의 작은 광원은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며, 나무의 형태는 몸 깊숙이 새겨진 자연의 기억을 건드린다. 이 모든 것이 겹쳐질 때, 트리 앞에 서면 괜히 숨이 길어진다.
올해도 어김없이 트리에 불을 켰다. 내년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지난 시간을 정리하기 전에, 나는 잠시 그 앞에 서서 불빛이 깜빡이는 모습을 바라본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장면은 여전히 설명을 넘어선다. 문득 과학도 결국은, 우리가 왜 이런 순간에 위로 받는지를 뒤늦게 따라가는 언어에 불과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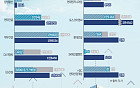

![중고차까지 확장…車업계, 오프라인 접점 넓히기 [ET의 모빌리티]](https://img.etoday.co.kr/crop/140/88/2271762.jpg)






![삼성전자와 소름 돋게 똑같은 상황! 2026년 증시 탑픽 '이 주식' ㅣ 이영훈 iM증권 이사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iOJFEN8RxHs/mqdefault.jpg)
![[오늘의 증시일정] 레이저옵텍](https://img.etoday.co.kr/crop/85/60/2272189.jpg)








![50만→780만 원…정지선·이수경이 밝힌 술테크 투자법 [셀럽의 재테크]](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71814.jpg)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하는 장동혁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720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