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 넘쳐나도 ‘숙련공 부족’ 골머리
10여년전 기술인력 대규모 구조조정
고교·전문학교 관련 학과도 사라져
2027년 부족 인력 13만명 달할 것

‘슈퍼 사이클(초호황기)’에 진입한 조선업계에 ‘사람이 없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10여 년 전 불황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현장을 떠난 기술자(장인)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고 남은 숙련공도 하나둘 이탈하고 있다. 일은 고되고 처우는 제자리. ‘조선소=힘든 일자리’라는 인식에 신규 인력 유입도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다. 수주 물량은 쌓이지만, 공장은 비어가는 ‘공정 병목’이 산업 곳곳을 옥죄고 있다.
20일 조선·해양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조선업 피보험자 수는 11만6072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간 회복세는 나타났지만 호황기였던 2014년(20만3000명)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작년 상반기 기준 조선업의 인력 미충원율은 14.7%로 전 산업 평균(8.3%)보다 6.4%포인트(p) 높았다. 특히 용접, 도장, 배관 등 고난이도 숙련 기술 분야의 인력난은 ‘심각’ 수준이다.
조선업계는 최근 중국과의 저가 경쟁을 피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등 고부가 선박 수주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고부가 선박일수록 품질을 좌우하는 건 결국 ‘사람의 손’이다. 업계에선 “기술자의 부재는 결국 납기 지연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납기 지연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3대 조선사는 2023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총 23건의 계약기간 정정 공시를 냈다. 이 중 상당수는 인도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늦어졌다. 주요 사유로는 ‘숙련공 부족’과 ‘도크(건조장) 포화’가 지목된다.
대형 조선사들은 외국인 기능 인력을 투입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소 하청업체들은 사실상 ‘속수무책’이다. 블록 제작을 외주로 돌렸다가 숙련 인력 부족으로 전체 공정이 지연되는 일이 반복된다. 일부 조선소는 일정 맞추기를 위해 값싼 중국산 블록을 긴급 투입하는 사례도 속출한다.
기술 전승 단절 우려도 짙어지고 있다. 생산직 평균 연령은 4050대. 현장에선 “2030대 내국인 인력을 찾기 어렵다”는 말이 공공연하다.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에서는 조선 관련 학과가 폐지되거나 명칭을 바꿔 ‘융합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추세다. 전통적 설계와 조선공학 교육 기반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조선업계 인력 부족이 연평균 1만2000명 수준이며, 2027년에는 이 규모가 13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정부도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외국인 숙련 인력(E-7) 허용 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상생 패키지’로 외국인력 쿼터, 숙련공 양성, 신규채용 지원 등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는 숙련기능 인력 비자(E-7-4) 전환 규모를 연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렸다.
지방정부도 팔을 걷었다.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해 580개 조선·해양 업체가 있는 울산시는 우즈베키스탄과 협력해 ‘울산 글로벌 인력양성센터’를 설립, 현지 교육을 거쳐 울산 조선업체에 배치할 계획이다.
조선업계는 스마트 조선소 전환, 자동화 기술 고도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완책’이다. 한 대형 조선소 관계자는 “외국인 인력 도입은 임시방편일 뿐, 숙련된 내국인 기술자를 확보하고 그들이 산업을 떠나지 않게 하는 구조 개혁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숙련공을 양성하고 이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장인이 떠난 조선업은 결국 중국에도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BTS 뜨자, 들썩이는 티켓값⋯올해 인상 릴레이 시작될까? [엔터로그]](https://img.etoday.co.kr/crop/140/88/2278150.jpg)
![산리오 가고 리락쿠마·먼작귀 온다…이디야·롯데시네마 콜라보 [그래픽]](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1648.jpg)

![[환율마감] 원·달러 10일째 올라 3주만 최고…엔화약세+달러매수](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150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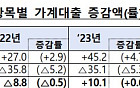





![에코프로 '이때' 무섭게 오를 수 있습니다. 뜻밖에 만날 호재와 상승 모멘텀 분석해드립니다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F5mfHb3Z8_o/mqdefault.jpg)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마무리…배경훈 “목표설정·집중투자” 강조 [종합]](https://img.etoday.co.kr/crop/85/60/2281652.jpg)





![BTS 뜨자, 들썩이는 티켓값⋯올해 인상 릴레이 시작될까? [엔터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78150.jpg)
![우원식 의장, 한병도-송언석 원내대표 회동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816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