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욱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23일 “혼합형제도는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짬짜면식 설계가 가능해졌지만, 실제로는 회사 단일 설정비율만 허용되는 구조로 인해 근로자 개개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춰 비율을 조절할 수 없다”며 “이 같은 구조적 한계가 제도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혼합형제도는 법적으로 ‘DB와 DC를 함께 설정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도입된 실무 개념으로 예컨대 퇴직금의 50%는 DB로, 나머지 50%는 DC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는 관리 편의성과 금융사 부담 등을 이유로 회사가 하나의 설정비율만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60:40, 30:70 같은 개인 맞춤형 조합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실질적으로 혼합형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경영성과급을 DC로 적립하기 위한 99:1 혼합형 구조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성과급을 DC 계좌로 이관할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돼 세금 및 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점을 노린 전략이다.
혼합형의 비중 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생애 단계별로 DB와 DC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른다. 김 상무는 “호봉제가 뚜렷한 기업은 초기에 DB로 가입하고, 임금 상승폭이 큰 시점에 DC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반면 연봉제나 승진에 따른 급여 차이가 크지 않은 기업에서는 혼합형이나 DC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퇴직연금 관리에 있어 핵심은 제도의 명칭보다 실제 운용 전략이다. 김 상무는 “혼합형제도는 개인 설정비율이 허용되지 않는 한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현 제도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하나의 제도를 선택하고 시기별 전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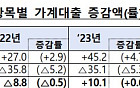

![[단독] '부패한 이너서클' 정조준 속…백종일 JB금융 부회장, 9일 만에 돌연 사임](https://img.etoday.co.kr/crop/140/88/2232182.jpg)







![에코프로 '이때' 무섭게 오를 수 있습니다. 뜻밖에 만날 호재와 상승 모멘텀 분석해드립니다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F5mfHb3Z8_o/mqdefault.jpg)










![최종화 '흑백요리사2'…외식업계 활력 불어넣을까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81040.jpg)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 뉴스 시청하는 시민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8143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