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봉순이네 과일가게 아주머니는 점심시간에 배달시킨 국밥으로 끼니를 때우신다. 그것도 손님이 오면 먹던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과일을 주워 담는다. 막무가내 흥정해 들어오는 손님을 허허 웃으며 받아주고 계산한다.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아주머니의 식도염이 이해되는 순간이다.
항상 9시 정각에 병원에 오셔서 약을 타시는 가구점 사장님은 항상 같은 시간에 정갈한 복장과 용모로 출근하신다. 일절 흐트러짐 없는 그의 생활에서는 미세한 증상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다. 그가 자주 병원을 찾는 이유이다. 어쩌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향할 때 퇴근하고 집으로 오는 환자들을 두세 명 만난다.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다들 고된 하루를 보냈나 보다. 사실 나도 고된 하루를 보내고 퇴근하는 것이니 동병상련이다.
얼마 전 점심시간에 머리를 자르려 동네 이발소에 갔다. 저렴한 남성 전용 커트 가맹점이어서 손님이 많았다. 대기하는 분 중 몇몇 분이 우리 환자였다. 가게 사장님도 우리 환자였고, 그러고 보니 미용사도 우리 환자였다. 대기 번호 7번을 받아들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6번을 든 우리 환자 한 분이 오시더니 원장님 이거 다 기다리다간 오후 진료 늦는다며 자기 번호표로 먼저 자르라고 한다.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다. 몇 번을 권하시는데 우리 병원에서도 한참을 기다리던 지루한 때가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그럴 수는 없어 끝내 사양했다.
며칠 전 어지럽고 기운이 없다고 진료를 봤던 미용사의 일솜씨가 다부졌다. 대부분 어르신이었는데 까다로운 주문에도 친절하게 받아주었다. 몸이 힘들어도 활기차게 일하는 미용사가 장인(匠人)처럼 느껴졌다. 7번 내 차례가 되었다. 원장님이 오셨다고 미용사가 한바탕 웃는다. 여기에 앉으라는 말에 나는 겸손히 네, 하고 대답하고 마치 의사 앞의 환자처럼 내 머리를 그녀에게 맡겼다. 조석현 누가광명의원 원장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4089.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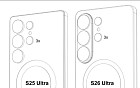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4253.jpg)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4120.jpg)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2577.jpg)



![삼성전자 주가 이제 겨우 '여기' 입니다. '여기까지' 열고 보세요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IZ_RFIDF4Po/mqdefault.jpg)






![공간이라는 이름의 계급 [읽다 보니, 경제]](https://img.etoday.co.kr/crop/85/60/2284067.jpg)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84253.jpg)
![KB금융그룹, 보험-은행 복합점포 ‘KB골든라이프 플래그십 센터’ 오픈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842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