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사건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무려 7일간 구금됐다. 이들은 죄수복을 입고 머그샷을 찍고, 수갑과 쇠사슬까지 찬 채 72인실에 수용됐다. 그 과정에서 “니하오”, “노스 코리아” 같은 조롱까지 들었다. 단순 행정 절차라기엔 인종차별과 인권침해가 노골적이었다. 미국은 동맹국에 모욕을 줬다.
경제 협상에서도 양상은 다르지 않다. 한·미는 7월 말,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직·간접 투자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회담 결과였다.
그러나 이후 구체적인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은 대출·보증 등 간접투자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미국은 ‘자국 주도권 아래의 직접 투자’를 요구한다. 어렵게 도출한 합의도 이런 식으로 흔들린다. 투자금을 회수한 뒤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길 원한다니, 일본이 조선 쌀을 수탈했다는 역사가 떠오른다.
관세와 규제를 압박 카드로 휘두르면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고용을 창출해도 “충분하지 않다”며 추가 투자를 요구한다.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선 인권침해도, 외교적 결례도 개의치 않는다.
미국은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힘을 쥐고 있다. 그만큼 책임도 져야 한다. 동맹국을 배려하고, 인권·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나가며, 도덕적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지금의 미국은 그렇지 못하다. 동맹국을 파트너가 아닌 하청업체도 못한 존재로 대한다. 글로벌 질서를 뒤흔들고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동맹국을 조롱하고 탈탈 털어가는 ‘21세기 강화도조약’을 일삼고 있다.
자발적 협력이라지만 선택지는 없다. 받아들이거나 시장에서 도태돼야 한다. 그 앞에선 인권도, 동맹도, 국제 규범도 무력하다.
그 피해는 결국 누구에게 돌아갈까. 150년 전 강화도조약은 당시 지배층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포장됐지만, 그 결과는 국민 모두에게 굴욕으로 남았다.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4089.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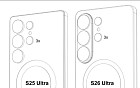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4253.jpg)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4120.jpg)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2577.jpg)



![삼성전자 주가 이제 겨우 '여기' 입니다. '여기까지' 열고 보세요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IZ_RFIDF4Po/mqdefault.jpg)

![[BioS]온코닉, 'PARP/TYKS' 난소암 2상 IND 승인](https://img.etoday.co.kr/crop/85/60/2089797.jpg)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84253.jpg)
![KB금융그룹, 보험-은행 복합점포 ‘KB골든라이프 플래그십 센터’ 오픈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842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