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살고, 여러 형제를 둔 그야말로 다복한 집안이다. 장성하여 가정을 이룬 아들딸들 모두 제 앞가림하고 사니 누가 봐도 부러운 집안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명절만 되면 어느 집안보다 더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연휴가 길었던 올 추석이라고 예외였던 것은 아니다. 아침에 차례를 지낸 다음 점심때가 가까워지자 그 집 어머니는 안절부절못하며 시집간 두 딸을 기다린다. 딸들의 시댁도 서울이다. 큰딸은 방금 전에 사위와 함께 도착했는데, 작은딸은 아직 오지 않는다.
어머니는 기다리다 못해 딸에게 전화를 건다. 작은딸은 누가 들을세라 작은 목소리로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어머니는 차례를 아직 안 지냈느냐, 지냈는데 왜 못 떠나느냐고 묻는다. 딸은 거듭 작은 목소리로 “보내줘야 떠나지” 하고, 저쪽에 부려야 할 짜증을 친정어머니에게 부린다. 이어지는 대화를 더 받아 적으면 이렇다. “왜 안 보내 주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전화를 끊고 딸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투덜투덜 사돈 불평을 한다. 차례를 지냈으면 얼른얼른 아이들을 보내줄 것이지 무얼 하느라 여태 붙잡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가슴속에 든 말을 그대로 내뱉는다. 그때 이 집의 아들 하나가 나서서 어머니의 약을 올리듯 싱긋싱긋 웃으며 말한다. “어머니, 그렇게 말할 게 어디 있겠어요?” “왜 못해? 너는 지금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다는 거냐?” “아뇨. 틀린 말이 아니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 집도 아침 차례를 지낸 다음 친정에 들러야 할 며느리를 둘 다 그대로 붙잡고 있잖아요?”
그 말에 어머니는 쌩하고 목소리를 높인다. “누가 안 보내준다니? 얘들은 걔들이 오는 거 보고 가야지. 걔들이 오면 상은 누가 차리란 말이냐?” 그러자 아들도 이때만은 어머니 약을 올리기로 작정을 한 듯 다시 빙글거리듯 말한다. “그러게 말이지요. 아마 그 집도 지금 이 집처럼 자기 집 딸이 오면 상을 차릴 사람이 없어서 남의 집 딸을 붙잡고 있는 건지도 모르지요.” 점심 때가 지나 간신히 친정에 온 이 집 딸도 잠시 전 시댁에서 자신이 겪은 상황을 잊고 이렇게 말한다. “어, 그런데 이 집 며느리들 다 어디 갔어?”
한 편의 상황극처럼 일부러 꼬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은 언제나 이런 식이다. 버선 속을 뒤집듯 이렇게 뒤집으면 내 처지와 남의 처지가 바로 보인다. 그런데 그걸 내 입장에서만 보려고 한다. 내년 추석까지 갈 것도 없이 서로 세배를 하러 다니는 다음 번 설 때라고 달라질까?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달라지지 않는다. 다음 번 설에도 그 집 어머니는 여전히 자기 집 며느리들은 꼭 붙잡은 채 자기 딸을 보내주지 않는 사돈댁 처사에 대해 다시 한 번 부글부글 속을 끓이며 있는 불평 없는 불평 다 뱉을 것이고, 그 집 며느리는 이제나 저제나 나를 보내주나 시계만 쳐다볼 것이다. 그리고 그 집 딸들 역시 오후 늦게 가까스로 시댁에서 나와 친정에 오자마자 이 집 며느리들은 명절에 집 안 지키고 다 어디 갔느냐는 말부터 내뱉을 것이다.
명절 스트레스, 제삿상이 어떻고 일이 어떻고 핑계대지 마라. 사람이 스트레스다. 그건 명절 아닌 모임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들 내 입장만 생각하고 말한다.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4089.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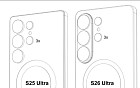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4253.jpg)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4120.jpg)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2577.jpg)



![삼성전자 주가 이제 겨우 '여기' 입니다. '여기까지' 열고 보세요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IZ_RFIDF4Po/mqdefault.jpg)








![[급등락주 짚어보기] 한신기계, 원전 밸류체인 부각에 上⋯코스닥서 보성파워텍ㆍ우리기술ㆍ일진파워 등 ↑](https://img.etoday.co.kr/crop/85/60/2284281.jpg)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84253.jpg)
![KB금융그룹, 보험-은행 복합점포 ‘KB골든라이프 플래그십 센터’ 오픈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842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