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는 상대적 유리, 다자녀 가구는 불리한 구조 고착

최근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이제는 평범한 4인 가구 절반 이상이 전기요금 누진제의 최고 구간에 포함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는 8년째 손질되지 않은 채 방치돼, 1인 가구는 혜택을 보는 반면 다자녀 가구는 사실상 ‘역차별’을 받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누진제가 본래 의도했던 ‘과소비 억제’ 수단이 오히려 보편적인 가정에 징벌적 요금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정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며, 산업용·일반용(상업용)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7∼8월 가정용 전력 요금은 △300kWh 이하(1kWh당 120원) △300~450kWh(214.6원) △450kWh 초과(307.3원)로 구분된다. 기본요금도 300kWh 이하일 때는 910원이지만, 이를 넘으면 1600원, 450kWh 초과 시 7300원으로 뛴다. 결국 ‘300·450kWh’ 구간이 가정 전기요금의 분수령이 되는 셈이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1974년 1차 오일쇼크 직후 도입됐다. 당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일부 고사용 가정에 징벌적 요금을 부과하는 취지였다. 이후 여러 차례 조정이 있었지만, 현행 기준인 ‘450kWh 초과 = 최고 구간’ 체계는 2018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문제는 소득 증가와 냉방기기 보급 확대, 전기화 추세 등으로 가정의 평균 사용량 자체가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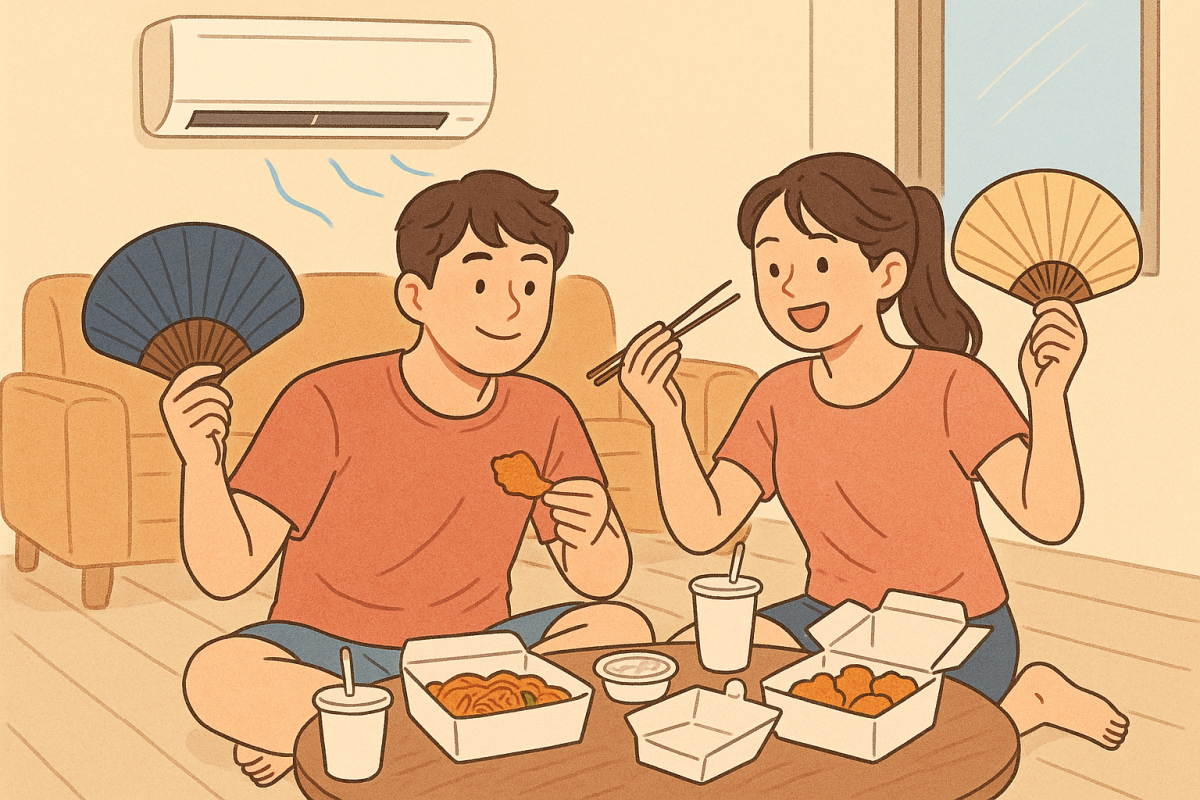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여름 4인 가구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427kWh였다. 업계에서는 최근에는 평균이 500kWh에 근접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한전이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체 2512만 가구 가운데 1022만 가구(40.5%)가 450kWh를 넘겨 최고 구간에 포함됐다. 반면 1단계 가구는 895만, 2단계는 604만 가구에 불과했다. 이제는 ‘전기 과소비’로 불리는 3단계 가구가 오히려 가장 흔한 전형이 된 것이다.
문제는 1인당 사용량이 적어도 가족 수가 많으면 불이익을 본다는 점이다. 예컨대 1인 가구가 300kWh, 4인 가구가 600kWh를 쓰면 1인당 사용량은 각각 300kWh와 150kWh로 차이가 크다. 그러나 요금은 각각 4만6000원, 14만6000원으로, 4인 가구가 3배 이상 내야 한다. 이 때문에 “현행 체계가 다자녀·다세대 가구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장철민 의원은 “현 전기요금 누진제는 기후와 생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다자녀 가구에 불이익을 줘 출산 장려 기조에도 역행한다”고 말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OECD 주요국에서는 흔치 않은 제도다. 가스나 난방 요금도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구간 조정은 물론 제도 존속 여부까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https://img.etoday.co.kr/crop/140/88/2304069.jpg)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https://img.etoday.co.kr/crop/140/88/2303979.jpg)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https://img.etoday.co.kr/crop/140/88/2303823.jpg)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https://img.etoday.co.kr/crop/300/170/2304069.jpg)
!['2천원 넘을라, 기름값 어디까지?'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30405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