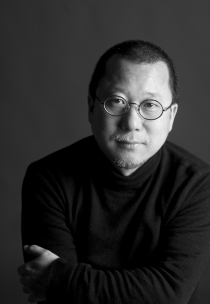
“초록 이끼와 담쟁이넝쿨이/식민지 시대의 옛날 도서관의 적벽(赤壁)을 가렸다/옛날의 도서관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은퇴한다, 그러면 또 새로운 젊은 도서관들이/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다/나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첫사랑의 집 앞을 지날 때처럼 늘 가슴이 두근댄다//세상이 나를 마른 땅에 내팽개쳤을 때/나는 붉은 아가미를 벌렁거리며 버둥거렸다/그때 열일곱 살이던 소년은 시립도서관 찬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붉은 어둠이 밀려온 창밖을 내다본다/거기 캄캄하게 미래들이 달려온다/소년은 무서웠고, 그래서 도망간다”(졸시, ‘옛날의 도서관’)
설렘과 기쁨을 안고 도서관을 가던 그 아침들의 상쾌한 기억이 아직 선명하다. 정독도서관에서는 시집과 철학책을 읽었다. 특히 가스통 바슐라르라는 프랑스 철학자의 책을 읽는 게 좋았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환하게 비쳐들던 참고열람실에서 ‘촛불의 미학’을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읽었다. 숲속 도서관의 사서로 일하는 사람이 한 “이곳에서 책을 읽는 동안 시간은 세상이 아닌 내게 맞춰 흐른다”(아오키 미아코)라는 말에 공감한다. 나도 도서관에서 충일감과 고요 속에서 오직 손에 든 책에 몰입을 할 때 시간이 내게 맞춰 흐른다고 생각했다.
20대 중반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의 꿈을 이루고, 출판사에 취업을 하면서 바빠졌다. 그런 탓에 더는 정독도서관을 찾지 못했다. 도서관을 다시 찾은 것은 서른 몇 해가 훌쩍 지난 뒤다. 정독도서관에서 2주 연속 강연자로 나를 초청했다. 도서관 정원의 고만고만한 느티나무들이 거목으로 변한 것이 놀라웠다. 나는 격정에 휩싸인 채 두 시간 강연을 마쳤다. 반응은 뜨거웠다. 강연장을 찾은 많은 청중이 도서관에 습작을 하며 시간을 보내던 한 청년의 귀환을 반기며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강둑에서 젖은 발을 말리는 집시소년을/보았다, 소년은 내게 도서관에 도착하거든/도서관의 지느러미들이 잘 있는가를 살펴봐달라고 부탁한다/누군가 그것들을 노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거리에는 사내들이 거드름을 피며 걸어간다/기억과 욕망이라는 서가를 천 개씩이나 가진 도서관/새의 발자국이라는 제목의 책/나무 그늘이라는 제목의 책/찰나의 그림자라는 제목의 책/나는 그 세 권의 책을 대출받아야 한다//나를 키운 것은 도서관이다/내 침울함을 치유한 것도 도서관이다/빗방울이 흰 종아리를 내보이며 종종걸음으로 뛰어가는 아침에/나는 도서관으로 간다”(졸시, ‘도서관을 위하여’)
나는 단연코 도서관 키드다. 나를 키운 건 도서관이다. 날마다 도서관을 찾던 젊은 시절 도서관이 나를 환대한다고 믿었다. 지금 내가 아는 지식과 도덕과 교양은 모두 도서관에서 얻은 것이다. 젊은 날의 도서관은 내 어린 영혼의 인큐베이터이자 청정한 도량, 그리고 회복과 치유의 장이었다. 지금 내가 사는 파주 교하에 훌륭한 사서들과 장서가 풍부한 교하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행운인가. 벚꽃 만개한 봄날 오후, 나는 콧노래 흥얼거리며 걸어서 교하도서관엘 갈 작정이다.

![BTS 뜨자, 들썩이는 티켓값⋯올해 인상 릴레이 시작될까? [엔터로그]](https://img.etoday.co.kr/crop/140/88/2278150.jpg)
![산리오 가고 리락쿠마·먼작귀 온다…이디야·롯데시네마 콜라보 [그래픽]](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1648.jpg)

![[환율마감] 원·달러 10일째 올라 3주만 최고…엔화약세+달러매수](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150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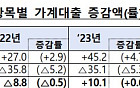





![에코프로 '이때' 무섭게 오를 수 있습니다. 뜻밖에 만날 호재와 상승 모멘텀 분석해드립니다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F5mfHb3Z8_o/mqdefault.jpg)







![[채권마감] 보합권 속 커브만 스팁, 미국채 강세 vs 금통위 경계](https://img.etoday.co.kr/crop/85/60/2270791.jpg)

![BTS 뜨자, 들썩이는 티켓값⋯올해 인상 릴레이 시작될까? [엔터로그]](https://img.etoday.co.kr/crop/85/60/2278150.jpg)
![BTS 뜨자, 들썩이는 티켓값⋯올해 인상 릴레이 시작될까? [엔터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78150.jpg)
![2차 교섭 개시한 서울시내버스 노사 '악수는 했는데'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8163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