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정신과 의사다. 환자들의 외로움을 진단명으로만 부르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질수록 ‘결핍’이라는 단어가 진료실 벽을 두드린다. 연인이 없어서 힘들다는 말은 단순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나는 선택받지 못했다”는 오래된 판결문이 들어 있다.
서른둘 현우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커플들을 피하려고 한 칸씩 옮겨 다닌다고 했다. “둘이 웃고 있으면, 제가 잘못 살아온 것 같아요.” 그는 웃음소리를 ‘증거’처럼 받아들였다. 나는 물었다. “그 웃음은 그들의 관계를 증명할까요, 아니면 그 순간의 날씨를 말할까요?” 현우는 잠깐 멈추더니 “날씨요”라고 답했다. 마음속 법정에 작은 이의신청이 올라간 순간이었다.
스물여덟 유진은 SNS를 삭제했다가 다시 깔기를 반복했다. “안 보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불안해져요. 세상에서 혼자 떨어져 있는 느낌.” 나는 그녀에게 ‘혼자’와 ‘떨어져’가 다른 단어라는 걸 이야기했다. 혼자는 현재의 상태이고, 떨어져는 내가 어디엔가 있어야 한다는 규칙에서 생기는 감각이라고. 유진은 “그럼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죠?”라고 물었다. 나는 답을 내리기보다, 함께 지도를 펼쳤다.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 사람, 행동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지도는 생각보다 넓었다.
크리스마스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건 촛불과 캐럴 때문이 아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의무가 될 때, 혼자는 벌이 된다. 그 벌은 보통 질문의 형태로 날아온다. “크리스마스에 누구 만나?” “왜 아직도?” 질문은 축하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엔 기준표가 있다. 기준표에서 벗어난 사람은 스스로를 숨기거나, 급하게 누군가를 구해오려 한다.
나는 상담실에서 종종 ‘연인의 부재’를 ‘관계의 공백’으로 바꿔 부른다. 공백은 비어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새로 쓸 수 있는 자리다. 물론 그 말을 듣는다고 바로 따뜻해지진 않는다. 현우는 “그 자리에 뭐라도 있어야 덜 쓸쓸할 것 같아요”라고 했고, 유진은 “저는 공백이 무서워요”라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뭐라도’를 서두르지 말자고 제안한다. 크리스마스는 하루고, 관계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의사라는 명찰 뒤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퇴근 후 빈 집에 들어가면,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때가 있다. 그럴 때 나는 스스로에게 처방전을 쓴다. “오늘 당신은 누군가의 밤을 함께 견뎠다. 그러니 당신의 밤도 함부로 대하지 말 것.” 따뜻한 국을 끓이고, 조명을 조금 낮추고, 휴대폰 알림을 잠시 끄고, 내일 아침의 나에게 짧은 메모를 남긴다. 혼자가 벌이 되지 않도록, 내 일상에도 판결문 대신 안내문을 붙인다.
연인이 없는 크리스마스를 ‘실패’로 규정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자꾸 시험한다. 나는 그 시험지를 빼앗아 찢어버리진 못한다. 다만 시험 대신 연습을 권한다. 혼자 있는 저녁을 통과하는 연습, 비교의 파도를 알아차리는 연습, 부러움이 올라올 때 “그래, 부럽다”라고 솔직히 말해주는 연습. 부러움은 나쁜 감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비추는 작은 손전등이니까.
크리스마스 전날 마지막 진료가 끝나고, 현우가 문을 나서며 말했다. “선생님, 내일은 그냥 영화 한 편 보고 오려고요. 혼자서요.” 유진은 “친구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커플 아닌 사람끼리 모여서요”라고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드디어 자신을 벌주지 않는 사람의 웃음으로 들었다.
거리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하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배운 건, 빛이 강할수록 그늘이 짙어지는 게 아니라, 그늘도 빛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연인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을 작은 방에 가두지 않기를. 누군가의 손이 없을 때에도, 자신의 손을 자기 어깨에 올려둘 수 있기를. 크리스마스는 누군가와 함께여도, 혼자여도 지나간다. 그리고 지나간다는 사실 자체가, 때로는 가장 확실한 위로가 된다. 최영훈 일산연세마음상담의원 원장

![[단독] 'K-디스커버리' 도입 박차…기업 소송 지형도 '지각변동' 예고 [증거개시제도, 판도를 바꾸다]](https://img.etoday.co.kr/crop/140/88/2261434.jpg)
![“나도 부자아빠” 실전 체크리스트…오늘 바로 점검할 4가지 [재테크 중심축 이동②]](https://img.etoday.co.kr/crop/140/88/227273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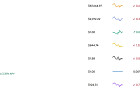

![[AI 코인패밀리 만평] 더 이상은 못 버텨](https://img.etoday.co.kr/crop/140/88/2272676.jpg)

![50만원 초고가 vs 1만 원대 가성비 케이크…크리스마스 파티도 극과극[연말 소비 두 얼굴]](https://img.etoday.co.kr/crop/140/88/2272103.jpg)



![삼성전자와 소름 돋게 똑같은 상황! 2026년 증시 탑픽 '이 주식' ㅣ 이영훈 iM증권 이사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iOJFEN8RxHs/mqdefault.jpg)
![[아파트값 상승 톱10]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아너힐즈’ 등](https://img.etoday.co.kr/crop/85/60/2272793.jpg)
![[오늘의 핫이슈] 미국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ㆍ일본 11월 선행지수 등](https://img.etoday.co.kr/crop/85/60/2272806.jpg)


![[글로벌 증시요약] 뉴욕증시, 경기 낙관론에 강세 마감…엔비디아ㆍ브로드컴 등 AI 관련주 상승](https://img.etoday.co.kr/crop/85/60/2272804.jpg)





![금값, 내년에도 오르기만 할까요?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72654.jpg)
![환율 장중 1484원 …연고점 근접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7264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