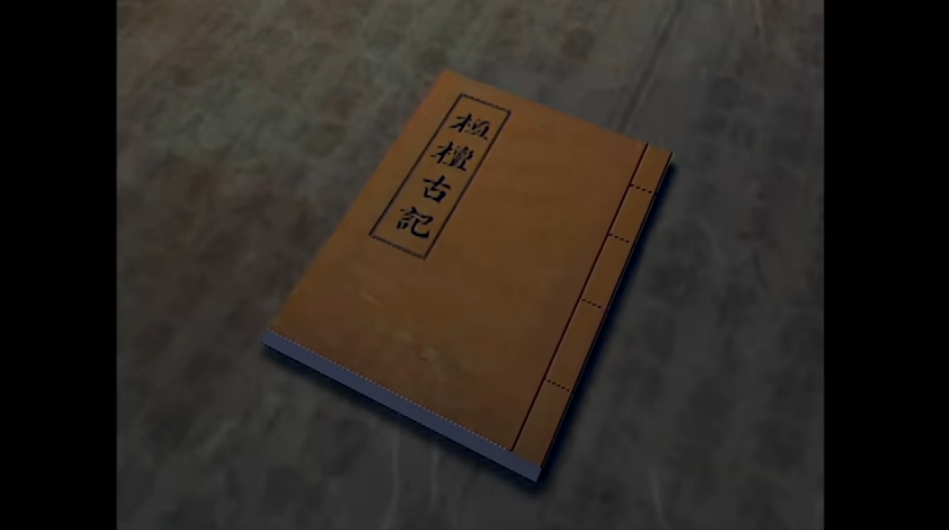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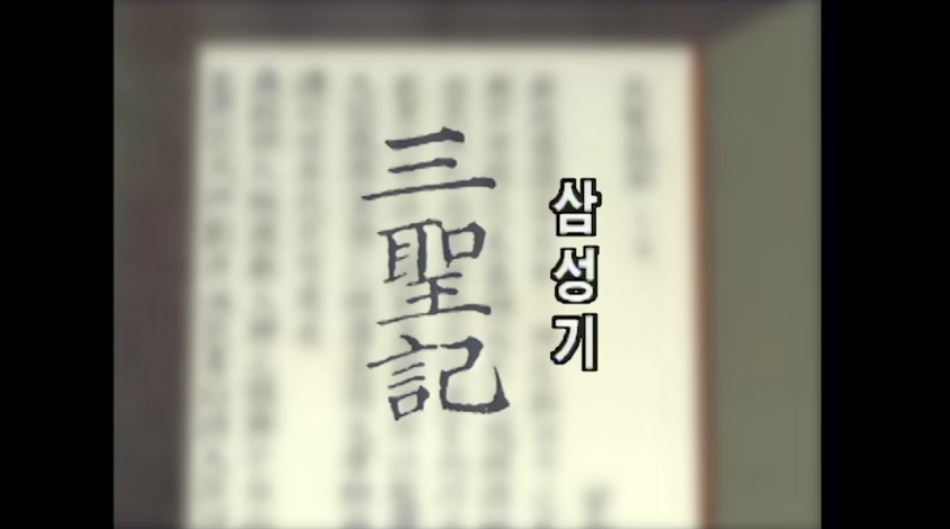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한 뒤, 야권의 비판과 대통령실 해명이 이어지면서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다.
환단고기(桓檀古記)는 제목 그대로 풀이하면 ‘환(桓)·단(檀)의 옛 기록’ 정도로 이해된다. 내용상으로는 환인·환웅·단군으로 이어지는 상고사부터 고려 말까지를 한 권(혹은 묶음)으로 서술했다고 알려져 있다.
다만 이 책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무엇을 담았나’만이 아니다. 언제, 누가, 어떤 경로로 ‘지금의 형태’가 성립했는가가 논쟁의 출발점이다. 환단고기를 ‘진서’로 보는 쪽은 계연수가 1911년경 여러 문헌을 모아 엮었다는 취지의 전승을 내세우지만, 학계의 다수 연구에서는 현대에 출판·유통된 형태(특히 1979년 무렵 출간·대중화 과정)를 문제 삼으며 사료로서의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정리가 반복됐다.
학술 연구에서 환단고기가 주로 ‘위서(僞書)’로 분류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갈래로 요약된다. 책의 성립·전승 경로가 교차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정리되기 어렵다는 점, 서술 내용이 기존의 고고학·문헌 사료 체계와 충돌하거나 설명하기 힘든 대목이 많다는 점, 근대 이후 형성된 민족주의적 상상력이 강하게 반영된 텍스트로 읽힐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이번 논란은 ‘환단고기’의 학술적 지위 논쟁이 정치권 공방으로 옮겨붙으며 커졌다.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환빠 논쟁’을 거론하고 동북아역사재단에 고대사 연구와 관련한 질문을 던진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 인사들은 “위서로 결론 난 책을 국가 역사기관의 과제로 올리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을 쏟아냈다.
대통령실은 “환단고기 주장에 동의하거나 연구·검토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김남준 대변인은 ‘분명한 역사관 아래 국가의 역사관을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였다고 설명했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도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환빠’라는 표현 자체가 대통령이 환단고기에 힘을 실은 것이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해명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https://img.etoday.co.kr/crop/140/88/2304069.jpg)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https://img.etoday.co.kr/crop/140/88/2303979.jpg)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https://img.etoday.co.kr/crop/140/88/2303823.jpg)





![[내일날씨] 주말 ‘아침 최저 –7도’ 꽃샘추위 기승](https://img.etoday.co.kr/crop/85/60/2304212.jpg)
![토요일 꽃샘추위…아침 -7도까지 떨어진다 [날씨]](https://img.etoday.co.kr/crop/85/60/2244197.jpg)





![[내일 날씨] 토요일 아침 ‘꽃샘 추위’…강풍에 전국 대부분 영하권](https://img.etoday.co.kr/crop/85/60/2303566.jpg)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https://img.etoday.co.kr/crop/300/170/2304069.jpg)
!['2천원 넘을라, 기름값 어디까지?'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30405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