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게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놀랐다. 작년 한 해에만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간 사람이 50만 명에 달하고, 이 중 100km 이상을 걸은 완주자가 24만 명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도 약 8000명이 이 길을 다녀왔다니, ‘순례길 광풍’이라는 말이 과장은 아닌 듯하다.
짧게는 수십km에서 길게는 800km 혹은 그 이상을 기꺼이 걷고 싶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단순한 여행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엇인가가 분명 있는 것 같았다.
순례길이나 제주 올레길 같은 장거리 도보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선 “생각이 맑아졌다”, “스스로를 다시 발견하게 됐다”는 말이 흔하다. 다소 진부한 표현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걷기가 뇌 기능과 정서적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연구들이 이 말의 신빙성을 더해준다.
우리 뇌에는, 속된 말로 ‘멍 때리는’ 상태라고 할까, 책을 덮고 스마트폰도 내려놓은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에 활성화되는 특정 뇌 회로들이 있다. 이들의 집합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DMN: Default Mode Network)라고 한다.
대표적인 영역으로는 내측 전전두엽(mPFC: medial prefrontal cortex)과 후방 대상피질(PCC: posterior cingulate cortex)이 있다.
전전두엽은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 성찰을 할 때 활발히 작동하며, 후방 대상피질은 과거의 기억 같은 것, 이를테면 여름 바람의 냄새, 혹은 어릴 적 부끄러움 같은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기억을 되살리는 데 관여한다.
이 외에도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때 반응하는 측두엽, 그리고 나와 타인,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는 두정엽 등도 이 네트워크에 속한다. 결국,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조용히 그려내는, 내면 탐색의 회로인 셈이다.
그리고 이 회로는 복잡하고 빠른 자극보다 조용하고 리듬감 있는 움직임 속에서 잘 작동한다. 순례길처럼 고요한 자연 환경 속에서 수시간씩 걷는 행위는 뇌에 과도한 정보처리 부담(인지 부하)을 덜어주고, ‘인지적 디폴트 상태’로 전환되게 만든다.
이 상태는 마치 컴퓨터를 초기 설정으로 되돌리는 것과 비슷하다. 특별한 목적 없이 자연스러운 리듬 속에 놓인 뇌는 비로소 자기 감정을 정리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상상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걷는 동안 우리의 뇌는 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정리 시간’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
장거리 도보여행의 또 다른 특징은 ‘몸의 리듬을 되찾는 것’이다. 대부분의 현대인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실내와 화면 앞에서 보내며, 인공 조명과 일정에 맞춰 움직인다.
반면 순례길 위에서는 해 뜨면 걷고, 해 지면 쉬는 원시적 생체 리듬(circadian rhythm)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된다. 프랑스 INSEP 체육과학연구소는 2022년 산티아고 순례자들의 생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보 여행 중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코르티솔)의 농도가 낮아지며, 심박과 혈압이 안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발표했다. ‘몸이 제자리를 찾으면 마음도 평온해진다’는 말이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셈이다.
글을 쓰다 보니, 친구의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다. 그 길은 단지 걷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천천히 따라 걸으며 정리해가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비록 지금의 나는 무릎이 버거워 그 길에 오르긴 어렵지만, 나에게도 언젠가는 천천히 나를 걷는 시간이 찾아오기를 바라본다. 어쩌면 그때가, 지금보다 더 ‘나다운 나’를 만날 수 있는 순간일지도 모르겠다.

![삶 만족도 낮으면 '자살 충동' 가능성 최대 5배 높아져 [나를 찾아줘]](https://img.etoday.co.kr/crop/140/88/227184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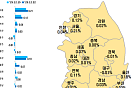









![삼성전자와 소름 돋게 똑같은 상황! 2026년 증시 탑픽 '이 주식' ㅣ 이영훈 iM증권 이사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iOJFEN8RxHs/mqdefault.jpg)








![[아시아증시] 미국발 훈풍에 성탄절 강세 마감…닛케이 0.13%↑](https://img.etoday.co.kr/crop/85/60/2273317.jpg)

![2025 밈 총결산 [해시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73114.jpg)
![명동성당, 성탄 대축일 낮 미사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7329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