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착취 피해 노인 10명 8명 "가족이"
"이상 거래시 금융기관 문의ㆍ일시 중단할 수 있어야"
금융소비자법·노인복지법 개정안 논의 지지부진

‘노인 금융 안전망’이 고령층의 경제적 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할 국가적 과제로 부상했다.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고령층을 겨냥한 금융 범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착취, 보이스피싱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 행위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노인 금융착취는 단순한 금융범죄를 넘어 생존권과 직결된다. 평생 일군 노후자금을 잃는 것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 노인의 삶 전체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족, 간병인 등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진행되는 만큼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2023년 5년간 신고된 경제적 학대 피해 노인 수는 2012명이다. 이 중 3명 중 2명이 75세 이상이다. 경제적 학대의 가해자 10명 중 8명이 노인의 친족이었다. 2023년의 경우 전체 사건 가해자의 78.4%가 배우자, 자녀 등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재산을 동의 없이 가로채거나 연금을 안 주는 등 경제적 학대를 일삼은 것이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도 노인층을 집중적으로 노린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 원으로 60대 이상(704억 원)이 36.4%를 차지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는 보이스피싱으로 2억 원 이상 고액 피해를 본 사람의 약 80%가 여성이었으며 60대가 과반수였다. 서울의 경우 강남3구의 피해액이 서울 전체 피해액의 약 30%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는 노인 경제적 학대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영국은 은행들이 노인 등의 비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감지하면 임시 계좌 동결 조처를 할 수 있다. 일본은 70세 이상 노인이 일정 금액 이상 거래나 평소와 다른 패턴을 보이면 금융사 직원이 확인 전화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우리나라도 금융당국과 국회가 법제도 개선을 통해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2020년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통해 ‘노인금융피해방지법’(가칭) 제정을 추진했다. 금융기관이 고령자 착취 의심 거래를 발견할 경우 지연·거절하거나 관계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성년후견인에 의한 착취 정황이 있을 경우 법원에 감독인 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전되지 않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노인 금융 착취 예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법과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하면서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행법상 고령자를 금융착취로부터 보호하는 별도의 구체적인 법률이 없는 상황이 가장 큰 취약점"이라며 "은행·보험·증권사에 ‘고령자 특화 AI(인공지능) 탐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일정 금액 이상 송금 시 자동 문의·일시 중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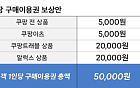

![일본 이어 대만까지…'대지진 공포' 여행 비상 [해시태그]](https://img.etoday.co.kr/crop/140/88/2274562.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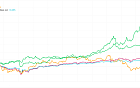


![RIA 稅혜택 늘리자… '서학개미' 셈법 복잡[서학개미 되돌릴까]①](https://img.etoday.co.kr/crop/140/88/2274018.jpg)



![삼성전자와 소름 돋게 똑같은 상황! 2026년 증시 탑픽 '이 주식' ㅣ 이영훈 iM증권 이사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iOJFEN8RxHs/mqdefault.jpg)





![[채권마감] 불플랫, 원화 강세+외인 선물 매수](https://img.etoday.co.kr/crop/85/60/2274626.jpg)
![[장외시황] 스트라드비젼, 21.63% 상승](https://img.etoday.co.kr/crop/85/60/2274620.jpg)
![[종합] 코스피, 반도체 강세에 4220선 마감…2%대 상승](https://img.etoday.co.kr/crop/85/60/2274587.jpg)


![일본 이어 대만까지…'대지진 공포' 여행 비상 [해시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74562.jpg)
![오세훈 서울시장 ‘전역사 1역사 1동선 확보 기념행사’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7453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