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자리가 무르익어 가는 동안 누군가 난로 옆에 몇 개 가져다 놓은 연탄을 가리키며 이 연탄 구멍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열아홉 개’라고 말했다. 우리가 어리거나 젊은 시절 연탄구멍을 세어보았을 때는 그랬다. 문제를 낸 사람은 아니라고 했고, ‘열아홉 개’라고 말한 사람 중 한 사람이 난로 옆으로 가서 하나 둘 셋, 하고 그것을 세었다. 예전 ‘19공탄’과 크기는 그대로인데 ‘22공탄’으로 바뀌어 있었다. 구멍 세 개만큼 원료와 원가가 줄어든 걸까? 모두 이게 언제 바뀌었지, 하는 얼굴이었다.
다시 한 사람이 그러면 이 연탄 한 장 값은 얼마일까요? 하고 물었다. 이천 원? 삼천 원? 먼저 구멍이 열아홉 개라고 대답할 때와는 달리 자신 없는 목소리로 두세 사람이 대답했다. 한 사람이 그냥 짐작컨대 천 원쯤 하지 않을까요? 대답했다. 물은 사람도 정확한 값을 모른다며 주인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가 천 원이라고 했다.
하루에 몇 장을 때나요? 물으니 좀 더 추운 날은 네 장을 때고 그날처럼 추운 날은 다섯 장을 땐다고 했다. 아주 작은 가게인데 하루 난방비 오천 원. 할머니가 소일삼아 거의 쉬는 날 없이 문을 여니까 음식 조리하는 데 쓰는 비용 빼고 가게 난방비 15만 원. 그게 할머니에게는 버거워 손님들이 조금 추워하는 걸 알면서도 불구멍을 쉽게 열 수 없다고 했다.
그날 연탄 구멍 맞추기로부터 시작해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또 멀게 느껴지는 여러 물건과 재료에 대한 재미있는 문제가 계속 이어졌다. 누군가 시멘트 한 포의 가격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고 물었다. 규칙은 휴대폰으로 검색하지 말고 대답하기. 그러나 문제를 낸 사람은 이미 몰래 답을 검색해보고 나서였다. 곧바로 1만 원, 2만 원, 하고 말하기 쉬운 답이 나왔다. 누군가는 3만 원, 5만 원이라고도 대답했다. 정답은 담배 한 갑 값과 비슷한 오천 원. 아니, 포장 값도 있는데 그렇게 싸?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었다.
“우리 어릴 때 우리나라는 왜 중동처럼 석유가 안 나오나, 많이 한탄했지.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에 석탄도 안 나고,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도 안 나고 그랬다고 해봐. 저 많은 아파트와 건물들, 그거 시멘트 다 수입해서 지어야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또 시멘트만큼 고마운 자원도 없는 거지.”
서로 묻고 답하기는 계속 이어져서 시멘트 한 포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하는 문제도 나왔다. 20kg이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고, 40kg이라고 제대로 답하는 사람도 있었다. 20kg이라고 답한 사람은 아니, 그렇게 무거운데 오천 원이라니, 하고 다시 놀랐다. 시멘트 포장과 크기가 비슷한 닭 사료와 소 사료의 무게와 가격 알아맞히기도 나왔다. 매일 달걀과 소고기와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먹으면서 정작 닭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의 수고와 거기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어둡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다들 먹고사는 문제에 골몰하느라 먹고사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들 어두웠다. 그날 춘천의 빈대떡 가게는 추우면서도 참 맛있었다.

![B형 독감 유행…A형 독감 차이점·예방접종·치료제·재감염 총정리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535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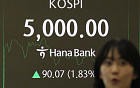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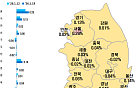

![서울 넘어 전국으로⋯아이돌은 왜 '우리 동네'까지 올까 [엔터로그]](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5428.jpg)

![BTS 따라 아미도 움직인다…월드투어 소식에 부산 여행 검색량 2375%↑ [데이터클립]](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5424.jpg)
![[단독] 현대제철, 직고용 숫자 수백명↓⋯이행하든 불응하든 '임금 부담' 압박](https://img.etoday.co.kr/crop/140/88/2284838.jpg)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폭풍 질주! '이때까지' 계속 됩니다 ㅣ 이영훈 iM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VbDC6fmseA/mqdefault.jpg)

![[상보] 국제유가, 우크라이나 휴전 3자 회담 소식에 급락…WTI 2.08%↓](https://img.etoday.co.kr/crop/85/60/2268616.jpg)

![[오늘의 청약 일정] ‘과천주암C1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당첨자 발표 등](https://img.etoday.co.kr/crop/85/60/2285440.jpg)
![[오늘의 IR] 삼성E&Aㆍ선익시스템ㆍHEM파마 등](https://img.etoday.co.kr/crop/85/60/2283150.jpg)
![[상보] 뉴욕증시, 그린란드 긴장 완화에 이틀째 상승…나스닥 0.91%↑](https://img.etoday.co.kr/crop/85/60/2284918.jpg)



![[케팝참참] 현역가왕3, 트로트 공식을 깼다…아이돌·뮤지컬까지 통했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85460.jpg)
![5000 터치한 코스피, 4950선 마감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8540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