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함께 사는 ‘공존인식’ 절실
국가차원 ‘생태 사회 전환’ 나서야

기후변화, 팬데믹, 에너지 불안, 경제 침체 등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복합 위기는, 현대 문명 구조가 가진 근본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인간 사회가 자연의 질서를 외면하고, 오직 내부의 ‘효율’만을 극대화해 온 결과다. 제러미 리프킨은 ‘회복력의 시대(The Age of Resilience)’에서 이를 “외부효과를 무시한 채 효율만을 추구한 문명의 파국”이라고 진단한다.
현대 자본주의는 생산성과 속도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기업은 비용 절감과 생산량 증가에 몰두했고, 국가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정책의 핵심 지표로 삼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태계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자원 고갈,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의 붕괴는 인간이 토해낸, 순환되지 않은 찌꺼기들이 지구 생태계에 축적된 결과다. 자연은 침묵 속에서 착취당하며, 인간의 폐기물을 묵묵히 받아내야 했다.
도시는 그 상징적 공간이다. 표면적으로는 녹지로 포장된 공원조차 실제로는 생물다양성을 억제한 채, 물과 농약을 대량 투입해 유지된다. 도시 전역을 뒤덮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는 자연의 숨통을 막고 지하수 순환을 차단한다. 이로 인한 열섬 현상과 침수 위험은 물론, 지구의 피부이자 생명의 기반인 표토(topsoil)가 사라지면서, 토지의 생산성과 회복력까지 위협받고 있다.
농업 또한 예외는 아니다. 20세기 중반 ‘녹색혁명’은 고수확 품종, 화학비료, 농약, 대규모 관개 기술을 통해 식량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증가시켰다. 하지만 그 대가는 생태 기반의 파괴와 지속가능성의 붕괴였다. 단작(單作)에 의존하는 현재의 식량 시스템은 생산성 약화와 수급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개인의 삶도 피폐해지고 있다. 신제품과 서비스를 끊임없이 소비하라는 압박은 사람들을 불안과 결핍감으로 내몬다. 진정 원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 소비에 내몰린다. 그러나 이런 삶의 방식이 결국 자신과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이제 문제는 명확하다.
더 이상 현재 삶의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다. 기후위기는 지구 생태계가 인간을 퇴출하려는 생존 본능의 발현이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대로 위기를 악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구 생태계의 법칙에 따라 생태사회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리프킨이 말하는 ‘회복력의 시대’는 더 빠르고 더 많이 생산하는 시대가 아니라, 적응과 공존의 원리가 상식이 되는 시대다. 자연은 순환하고 다양하며, 상호 의존적이다. 인간 또한 그 일부로 살아가야 한다. 자연을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존재로 인식하는 각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태문해력(ecological literacy)과 탄소문해력(carbon literacy)’을 갖춰야 한다. 물, 전기, 식량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배출한 탄소가 어떻게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지 이해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환경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시민 윤리이며, 미래 사회의 핵심 가치다.
교육은 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다행히 일부 선진국에서는 생태학교가 급속히 확산되고, 공교육 교과과정에도 채택되고 있다. 기술과 정책도 생태적 기준을 내장해야 한다. 전 세계가 다 함께 순환, 공존, 자율이라는 생태계의 법칙에 따라 국가의 정책, 기업의 비전, 개인의 일상이 생태적으로 변화되었을 때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성장’의 기준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양적 성장이 아닌,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중심에 두고, “부자의 삶”이 아니라, 더 깊은 내면의 만족을 지향하는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루빨리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교육·경제·도시계획 등 삶의 모든 영역에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해서.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 리더십을 발휘하여, 전 세계로 확산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미래를 이끄는 길이며, 6번째 대멸종을 피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단독] ‘애플 동맹 차질없게'⋯ 삼성, 美 오스틴 공장 현대화 착수](https://img.etoday.co.kr/crop/140/88/2273350.jpg)
![코스피 4000 돌파…정치권 K디스카운트 저주 풀었다 [증시 붐업 플랜]](https://img.etoday.co.kr/crop/140/88/227269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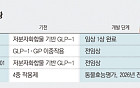



![[AI 코인패밀리 만평] 신종 달러 뜯기 방법...대성공~!](https://img.etoday.co.kr/crop/140/88/2273158.jpg)



![삼성전자와 소름 돋게 똑같은 상황! 2026년 증시 탑픽 '이 주식' ㅣ 이영훈 iM증권 이사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iOJFEN8RxHs/mqdefault.jpg)

![[BioS]SK케미칼, 넥스트젠바이오와 신약 공동개발 MOU](https://img.etoday.co.kr/crop/85/60/2273476.jpg)

![[종합] 트럼프, 성탄절에 ‘기독교인 살해’ IS에 공습 단행…“IS 대원 여러 명 사살”](https://img.etoday.co.kr/crop/85/60/2273462.jpg)

![[BioS]알테오젠, 글로벌 제약사와 'SC기술' 기술이전 "옵션딜"](https://img.etoday.co.kr/crop/85/60/1870122.jpg)




![2025 밈 총결산⋯한국인 밈 능력고사 [해시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70/2273114.jpg)
![명동성당, 성탄 대축일 낮 미사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90/2273297.jpg)